기도가 막혔을 땐 응급처치 어떻게?
2025-10-18

패혈증이란 우리 몸에 침투한 ‘균’에 의해 면역체계가 반응하면서, 조절되지 않는 과도한 염증 반응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균에 의해 오염된 혈액이 혈관을 타고 돌면서 순식간에 온 몸에 균과 독소를 퍼트려 여러 장기를 망가트리기 때문에 빠르게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징후가 나타났을 때 빠른 전문적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세브란스병원 감염내과의 구남수 교수가 <세브란스 소식>에 최근 올린 글에서 소개한 패혈증의 원인과 치료법에 관해 들어본다.
- ‘패혈 쇼크’라는 것은 무엇인가.
“염증 반응으로 인해 패혈증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장기부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 때 신장 기능 저하와 혈관 확장에 의해 상대적으로 혈액량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저혈압이 나타나는 상태를 ‘패혈쇼크’라고 한다.”
- 패혈증의 원인은 무엇인가.
“균에 의한 감염이다. 고령자에게 많이 발생하며,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더 많다. 폐렴이 원인인 경우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한다. 복강 내 감염, 혈류 감염, 효로 감염이 원인이 경우도 많다. 상처나 수술 부위를 통한 세균 감염, 식중독 또는 덜 익힌 음식 섭취로 인한 감염, HIV 감염이나 만성폐쇄성 폐질환이나 암에 의해서도 나타났다. 장기이식에 따른 면역력 저하로 인한 감염도 있다.”
- 어떤 증상으로 패혈증을 알 수 있나.
“발열과 함께 몽롱한 의식 상태가 나타나거나 수축기혈압이 100mmHg 이하로 떨어진다. 또 분당 호흡수 22회 이상으로 가쁜 숨을 내쉬게 된다. 이 밖에 피부색 변화와 소변량 감소도 주요 증상이다. 초기에는 일반 감염과 증상이 비슷해 그냥 지나치기 쉬운데, 조기에 증상을 인지해 병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 어떻게 진단하나.
“크게 세 가지가 있다. 먼저, 감염을 시사하는 증상이 있는지 확인한다. 기침 가래나 호흡곤란은 폐렴을, 복부통증과 압통은 복부감염을 시사한다. 배뇨가 부자연스럽고 늑골척추에 압통이 있으면 신우신염이 의심된다. 두통과 구토 등의 증상은 뇌수막염을 의심케 한다.”

- 혈액배양검사로 진단하기도 한다고 들었다.
“그렇다. 패혈쇼크 환자의 30~40%는 이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타난다. 검사 시행 전에 항생제를 투여하면 양성 비율이 3분의 1 정도 줄어들기 때문에 항생제 투여 전에 반드시 혈액배양검사를 먼저 시행한다.”
- 급성심부전 여부도 확인해야 하는 것으로 안다.
“의식상태 변화, 수축기 혈압 100mmHg 이하, 분당 호흡수 22회 이상 중 2개 이상 증상이 동반되면 곧바로 급성 심부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때는 활성 징후와 호흡기능, 의식여부, 간 기능 등을 점수화해 장기부전 여부를 나타내주는 SOFA 점수를 측정한다. 이 점수가 2점 이상이면 패혈증 진단을 내린다.”
-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하나.
“신속하게 광범위 항생제를 사용한다. 원인 미생물을 신속하게 억제해 줘야 한다. 감염 의심부위, 감염 발생지역, 환자 의료이력 등에 따라 적절한 치료제를 선택한다. 추후 원인균이 확인되면 항생제를 재조정한다. 적정 혈압을 유지하고 신체 각 조직에 혈액과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도록 적절한 수액 공급도 필수다. 특히 패혈쇼크는 혈압을 높이기 위해 혈관수축제 등의 약물을 쓴다.”
- 주요 장기를 보호하는 별도의 치료 조치가 병행되어야 하지 않나.
“그렇다. 호흡기, 신장, 심장 등 주요 장기의 기능을 보존하기 위한 치료가 병행된다. 이 경우 인공호흡기나 혈액투석기 등의 장비가 활용되기도 한다. 감염 부위에 농양이나 괴사가 있으면 감염원을 제거하기 위해 시술 또는 수술적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
- 예후는 어떤가.
“패혈증은 진행속도가 매우 빨라, 발병 후 수 시간 혹은 수 일 내에 사망할 수 있다. 증상이 나타나는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 대개 초기 72시간 내에 불응성 패혈쇼크로 사망에 이른다. 그 후의 사망은 다발성 장기부전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 장기간 입원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다제내성균에 의한 감염이 많아지면서 항생제 부재로 인한 사망 사례도 늘고 있다. 회복이 되더라도 생존율이 높지 않다. 우울증이나 인지기능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장기 후유증이 나타날 수 도 있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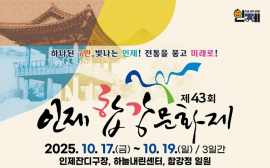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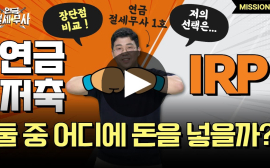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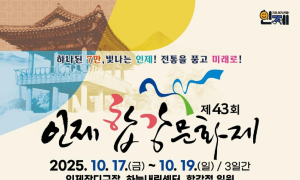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