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이슈] 서울시 생활만족도 1위 서초구, 꼴찌는 강북구… 내가 사는 자치구는?
2025-10-20

3년 전 일본에서 ‘플랜 75’라는 영화가 개봉되어 회제를 모은 적이 있다. 이 영화는 75세 이상 고령자의 안락사를 지원하는 제도가 국회를 통과하고 난 후를 그렸다. 감독은 “사람 목숨의 가치를 사회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기준으로 결정하는 풍조가 이미 사회에 만연한 것 같은 위기감에 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50년 고령인구 숫자는 1890만 명으로 지금부터 매년 평균 35만 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경록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은 “‘플랜 75’처럼 초고령화는 인간 목숨에 대한 생각을 바꿔버릴지 모른다”며 고령화에 대비한 체계적인 대비를 주문했다.
김 고문은 최근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에 기고한 글에서 고령화라는 도전에 임하는 세 가지 무기에 관해 설명했다. 그 첫 번째는, 기술혁신을 눈 여겨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급속도로 발전한 AI 기술은 소프트웨어를 벗어나 로봇과 결합되어 일상생활에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며 “AI는 로봇의 두뇌나 마찬가지이니 로봇이 퀀텀 점프로 진화하는 것이라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김 고문은 “고령사회는 이러한 첨단 기술의 수요자가 되고 있다”며 그 수요는 요양 로봇, 돌봄 로봇, 외골격 로봇, 바이오 테크, 디지털 헬스케어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첨단 AI 기술을 고령사회에 접목함으로써 부족한 노동력을 기술로 보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령사회 극복에 첨단 기술을 접목해야 그 기술을 고령화되는 세계시장에 수출할 수도 있다고 했다.
다음은, 해외에 길이 있다는 것이다. 고령사회에서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자산관리, 요양, 헬스케어 등은 성장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내수산업이 장기간 정체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지만, 그는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은 수출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글로벌 경제는 확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내수산업도 수출산업화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식품은 내수산업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최근 K-컬쳐의 붐에 힘입은 식품 산업의 해외 진출을 주목하라고 했다. 해외 젊은이들이 놀러 와 ‘올리브영’에서 물건을 사고 있다며, 외국인의 한국 내 지출 기회도 지적했다. 그는 “초고령사회에서의 산업구조는 우리의 인구구조가 아니라 우리가 해외 경쟁력을 얼마나 가지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노년부양비라는 숫자의 양적인 굴레에 빠지지 말고 숫자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65세 이상 인구수를 15세에서 64세까지의 인구수로 나눈 이 값이 너무 압도적이지만, 15세에서 64세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생산성을 높이는 한편 6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 비중이 높아지게 되면 실질적인 노년부양비율이 낮아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바꿀 수 없는 노년부양비율을 보고 운명론에 빠질 게 아니라 경제활동인구를 늘리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적·기술적 혁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문제는 젊은 인구가 줄어들면 혁신이 더뎌질 수 있다는 점”이라고 했다. 이를 막으려면 젊은이들의 혁신을 활성화하는 시스템을 탄탄히 마련하는 게 너무나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고문은 “초고령사회의 원년인 2025년부터 우리나라 고령사회 시계는 세계에서 제일 빠르게 간다”면서 “운명적 굴레에 빠지는 관점을 경계하고 기술, 해외, 혁신이라는 이 3가지를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것마저 놓치면 정말 희망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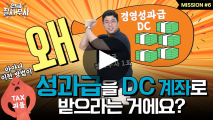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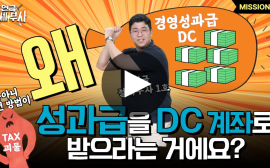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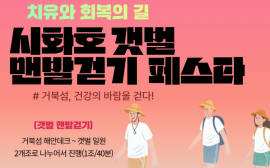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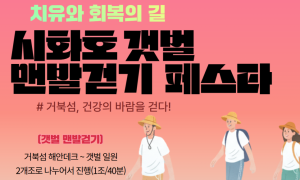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