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 국산 휴대폰을 사용하는 79만 명이 긴급 구조 상황에서 정확한 위치 추적이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의원(국민의힘)이 통신 3사에서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2019년 출시된 휴대전화 264종의 국내 이용자 중 78만 8971명이 긴급 구조 상황시 휴대전화 와이파이 신호를 이용한 정밀 위치 측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치정보법에 따라 경찰·소방 등 구조 당국은 재해, 납치 등 긴급 상황에서 구조가 필요한 이용자의 위치를 휴대전화 단말기가 보내는 기지국이나 와이파이, GPS 정보를 통해 추적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와이파이를 통한 위치 측정의 정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019년까지 출시된 구형 단말기 264종 이용자 가운데 알뜰 폰 사용 등으로 유심을 변경한 경우 와이파이 신호를 통한 위치 추적이 어렵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아직 어떠한 후속 조치도 나오지 않고 있다.
김장겸 의원은 “긴급 위치 측정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1년 전부터 제기됐지만 단말기 제조사인 삼성전자의 반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삼성전자가 보안과 유지관리 등의 문제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업 데이트를 단말기 출시 이후 2년까지 지원해 2016∼2019년 출시 단말기에 대한 추가 업 데이트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알뜰 폰을 많이 쓰는 고령층이 상대적으로 더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긴급 상황 시 구형 단말기 사용자들에게도 위험성을 알리고 안전 확보를 할 수 있는 후속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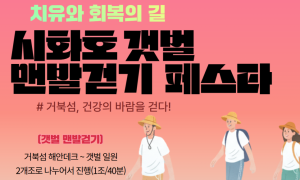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