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이슈] 서울시 생활만족도 1위 서초구, 꼴찌는 강북구… 내가 사는 자치구는?
2025-10-20

국내 고령자 고용정책 전문가 10명 가운데 6명은 법정 정년이 지금의 60세에서 65세로 상향조정될 경우 예상되는 가장 큰 부작용을 '청년 일자리 감소'로 진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경영·경제·법학 교수 210명을 대상으로 고령자 고용정책 관련 전문가 진단 및 인식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62.4%가 정년 연장의 최대 부정적 효과로 '청년층 신규 채용 감소'를 꼽았다.
이어 '낮은 생산성 대비 높은 비용에 따른 비효율'이라는 응다이 43.8%였고, '세대 갈등 등의 직장문화 저해'(23.8%),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19.5%)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고령자 노후 소득 문제 해결의 주된 책임 주체를 묻는 질문에는 '정부·국회'라는 응답이 63.8%로 가장 많았다. '근로자 개인'이라는 응답은 32.9%에 그쳤다. 민간기업이라는 응답은 1.9%였다.
경총 측은 다수의 전문가가 국민 노후 소득 보장의 일차적 책임은 국가에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정부가 고령자 계속 고용 정책을 추진할 경우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령 인력 활용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는 '고용방식 다양화'라는 응답이 68.1%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용유연성 제고'가 53.3%, '연공급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48.6%로 뒤를 아었다.
국내 노동시장에서 고령자 일자리 자체의 확대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는 '높은 임금 연공성'이라는 응답이 66.7%로 가장 많이 나왔다. 이어 '다양한 근로 형태 활용이 어려운 국내 법제도'(42.9%), '해고 제한 등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높은 고용 보호 수준'(38.1%) 등의 순이었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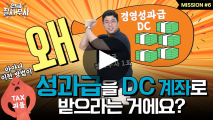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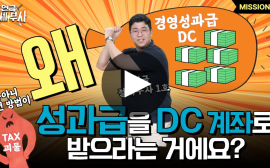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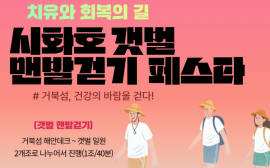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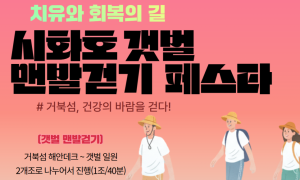

댓글
(0) 로그아웃